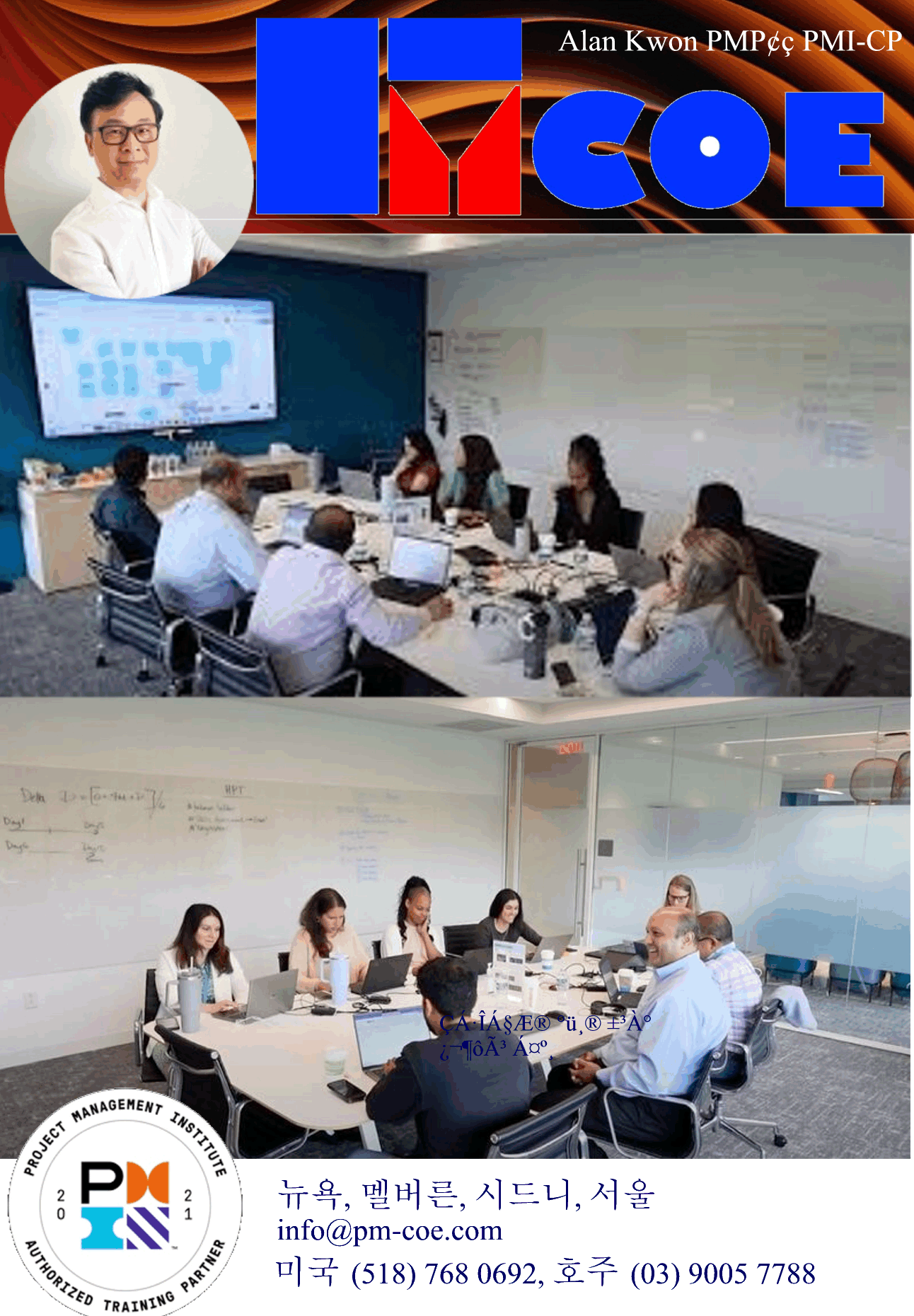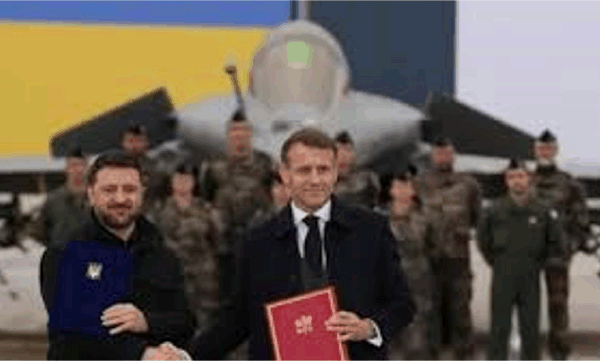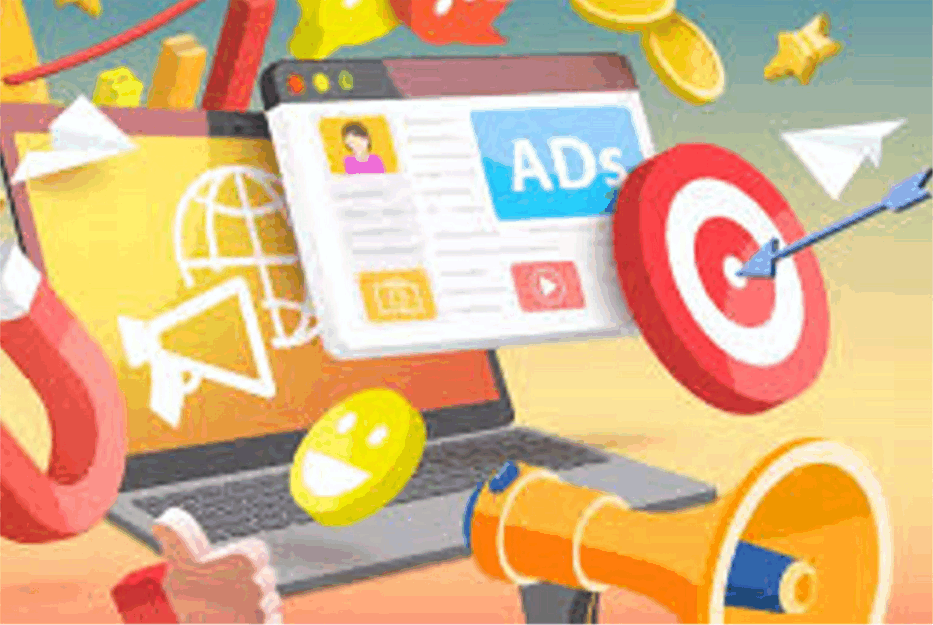호주인들은 소위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있는지 알아낼 예정입니다.
수요일 중순에 발표되는 국민계정은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출, 소득,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했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락한다면,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필요한 두 번의 파업 중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호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5월 금리인하 가능
수많은 공식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12월에 갑자기 벽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이 11월에 금리를 너무 많이 인상한 걸까요?
복도에 있는 미셸 블록.
더 읽어보세요
두 번째 파업은 소위 3월 분기라고 불리는 다음 3개월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분기 연속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아마도 재무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일의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든, 사실 우리는 이미 반세기 만에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2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헤드라인을 한쪽으로 치워두는 것입니다. 이는 3개월마다 전체 경제에 대한 지출, 소득 및 생산입니다.
이 수치는 대유행 이전에는 GDP 성장이 약했고, 봉쇄 기간에는 매우 약했고(2분기 연속 감소), 봉쇄가 끝나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방식인 1인당 지출과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재의 매우 높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1인당 GDP는 극히 약합니다. 현재 3/4 동안 감소하거나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Chris Richardson의 관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입니다.
불행하게도 통계청은 이를 웹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의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쉽습니다.
이는 가계에 발생하는 소득을 가계가 지불하는 가격에 맞게 조정한 다음 추가로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은 납부한 세금(2023년 중반 임시 세금 상쇄 만료로 인해 증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순이자 지불액을 뺍니다. 그 중 대부분은 모기지 지불금입니다.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Richardson은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을 “생활 수준”으로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출 감소, 물가 상승, 세금 부과 증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증가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생활 수준이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고통이 전해지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생활 수준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전 1인당 가처분소득 감소는 높은 실업률을 동반해 당시 일자리를 찾는 불운한 계층의 고통을 집중시켰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생활 수준의 하락은 (지금까지) 낮은 실업률을 동반하여 근로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국의 스프레드시트가 허용하는 가장 긴 기간)을 통해 보면 최근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의 급락은 반세기 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넓은 그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생활 수준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가 2000년대 광산 붐 기간에 생활 수준이 가속화되고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평탄(천천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부 지원으로 인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약간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로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경기침체 같은 건 없어
아마도 놀랍게도 우리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를 고려하면 심지어 호주 중앙 은행도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RBA, 금리 인하 논의 철회
단 절반의 문장으로 중앙은행 이사회는 수백만 명의 모기지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호주 경제도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사업가들은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이라고 적힌 반짝이는 검은색 표지판을 지나갑니다.
더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란 2분기 연속으로 지출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경기주기 전문가 Julius Shiskin이 쓴 1974년 New York Times 기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경제 활동의 2분기 감소가 경제가 경기 침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Shiskin의 선언은 이후 전 세계 언론인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그것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를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생활 수준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기 부양 프로그램에서 정치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호주는 중국이 곧 자국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ABC 인물 Laura Tingle, Annabel Crabb 및 David Speers
추가 분석
호주와 미국의 차이점
30년 전인 1990년 9월 국민계정이 11월 29일 공개된 후 폴 키팅(Paul Keating) 재무장관은 호주가 경기 침체에 빠졌음을 선언했습니다.
Keating은 다음과 같이 유명하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호주가 겪어야 했던 경기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살아남았지만, 이른바 ‘불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졌습니다. 경제 활동이 소폭 하락하고 이후 큰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 소폭 상승 후 큰 하락세로 수정되었습니다.
폴 키팅 재무장관
1990년 당시 재무장관인 폴 키팅(여기 사진은 1989년 예산의 밤 이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찍은 사진)은 호주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발표했습니다.(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어떻게? 호주 통계청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당연히 국민계정을 수정합니다.
개정안은 호주의 1990년대 초반 경기 침체를 1991년 3월과 6월 분기로 옮겼습니다.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재무장관 집권 하에 2000년 국민계정이 개정된 후 잠시 “불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 수정 후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전국 경제 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소집한 원로 위원회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문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요일 수치가 호주 경제 활동의 위축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예산을 준비하는 Jim Chalmers 재무장관에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도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터 마틴(Peter Martin)은 호주국립대학교 크로포드 공공정책대학원의 객원연구원입니다. 이 기사는 원래 The Conversation에 게재되었습니다.
16시간 전에 게시됨16시간 전에 게시됨, 13시간 전에 업데이트됨
Australians are set to find out if we are on the edge of a so-called “official” recession.
Due out mid-Wednesday, the national accounts will either show spending, incomes and production continued to grow in the three months to December, or show they fell.
If they fell, it would be the first of the two strikes needed for what some people call an “official” recession. (Though surprisingly, there’s no such thing here in Australia, as I’ll explain later.)
May rate cut possible
A raft of official economic data suggests Australia’s economy suddenly hit a wall in December. Is the data wrong, or did the Reserve Bank raise rates one time too many in November?
Michele Bullock in corridor.
Read more
The second strike would be a fall in the following three months, the so-called March quarter. If we get two quarters in a row, all manner of people — probably including the treasurer — will declare it a recession.
But whatever Wednesday’s data shows, the truth is we are already experiencing the biggest dive in living standards in half a century — and have been for two year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put to one side the headline increases or falls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ose are spending, income and production over the entire economy each three months.
Those figures show GDP growth was weak before the pandemic, very weak during lockdowns (shrinking for two successive quarters), then strong as lockdowns ended. It’s been exceedingly weak since.
But this tells us little about spending and income per person, which is how each of us experiences daily life.
Adjusted for our current very high rate of population growth, GDP per person is extremely weak. It’s been falling, or barely growing, for three quarters now.
What matters most for each one of us — in the view of Chris Richardson, formerly of Deloitte Access Economics — is re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Unfortunately, the bureau of statistics doesn’t display this on its website. But it’s easy enough to calculate from the bureau’s spreadsheets.
It’s the income accruing to households, adjusted for the prices paid by households, and then adjusted some more.
The bureau also subtracts taxes paid (which have climbed because of the expiry of the temporary tax offset in mid-2023). And it subtracts net interest payments, most of which are mortgage payments.
In his public presentations, Richardson says he refers to re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s “living standards”, because that’s what it measures.
It shows weak spending, rising prices, a greater tax take, and much greater payments on mortgages have been shrinking living standards for two years.
That’s how it has felt for two years, even if the way the pain has been spread has been different than in the past.
The biggest dive in living standards in half a century
Previous dips i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have been accompanied by high unemployment, concentrating the pain in the unlucky group looking for work at the time.
In contrast, this dip in living standards has been accompanied (so far) by low unemployment, pushing more of the burden onto working taxpayers.
Looked at through a longer-term lens (the longest the bureau’s spreadsheets allow) the latest dive in re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is the biggest in half a century.
The broad picture is of fairly steady living standards until the mid-1990s, accelerating living standards during the 2000s mining boom, and then fairly flat (rising slowly) after the 2008-2009 global economic crisis.
They jumped for a bit during the COVID lockdowns, because of all the government assistance. But they’ve been diving since.
There’s no such thing as an official recession
Perhaps surprisingly, given how much we talk about “official” recessions, even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says “there is no single definition of recession” here.
RBA pushes back on rate cut talk
In just half a sentence, the Reserve Bank board dashed the rate cut hopes of millions of mortgage borrowers. Does it risk condemning the Australian economy to recession as well?
Business people walk past a shiny black sign that reads “Reserve Bank of Australia”.
Read more
Many people talk about a recession meaning two quarters in a row of shrinking spending and income. This appears to date back to a 1974 New York Times article, written by a US business cycle expert Julius Shiskin.
He said two quarters of shrinking economic activity was of the criteria you could use to decide whether or not an economy was in recession.
Shiskin’s pronouncement was subsequently latched on to by journalists all over the world, who made it definition because it was simple.
“We’re experiencing the biggest dive in living standards in half a century — and a recession is looming
“Is it possible to take politics out of economic stimulus programs, to everyone’s benefit?
“Australia hopes China will soon drop tariffs on its wine, but the trade war continues to wreak havoc.
ABC personalities Laura Tingle, Annabel Crabb and David Speers
More Analysis
How Australia and the US differ
Three decades ago, after the release of the September 1990 national accounts on November 29, Treasurer Paul Keating declared they showed Australia in recession.
Keating famously adde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is is the recession that Australia had to have.”
Those words live on, but the so-called “recession” didn’t. It vanished soon after. What had been a small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followed by a big decline, got revised to become a small increase, followed by a big decline.
Treasurer Paul Keating
In 1990 then treasurer Paul Keating – pictured here at the National Press Club after Budget night 1989 – announced Australia was in the recession we “had to have”.(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
How?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revises the national accounts as a matter of course, each time new information comes in.
Its revisions moved Australia’s early 1990s recession to the March and June quarters of 1991.
A “recession” even briefly appeared after revisions to the 2000 national accounts, under Prime Minister John Howard and Treasurer Peter Costello. Then it disappeared, after further rev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ey’re not nearly as mechanical. There, there isn’t an official recession until a committee of elders convened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ays so. Its proclamations have broad support.
If Wednesday’s figures show Australia’s economic activity shrinking, we will hear a lot more about an “official” recession. But it will make little difference to Treasurer Jim Chalmers as he prepares this year’s May budget.
Just like the rest of us, he knows things are going backwards.
Peter Martin is visiting fellow at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originally appeared on The Conversation.
Posted 16h ago16 hours ago, updated 13h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