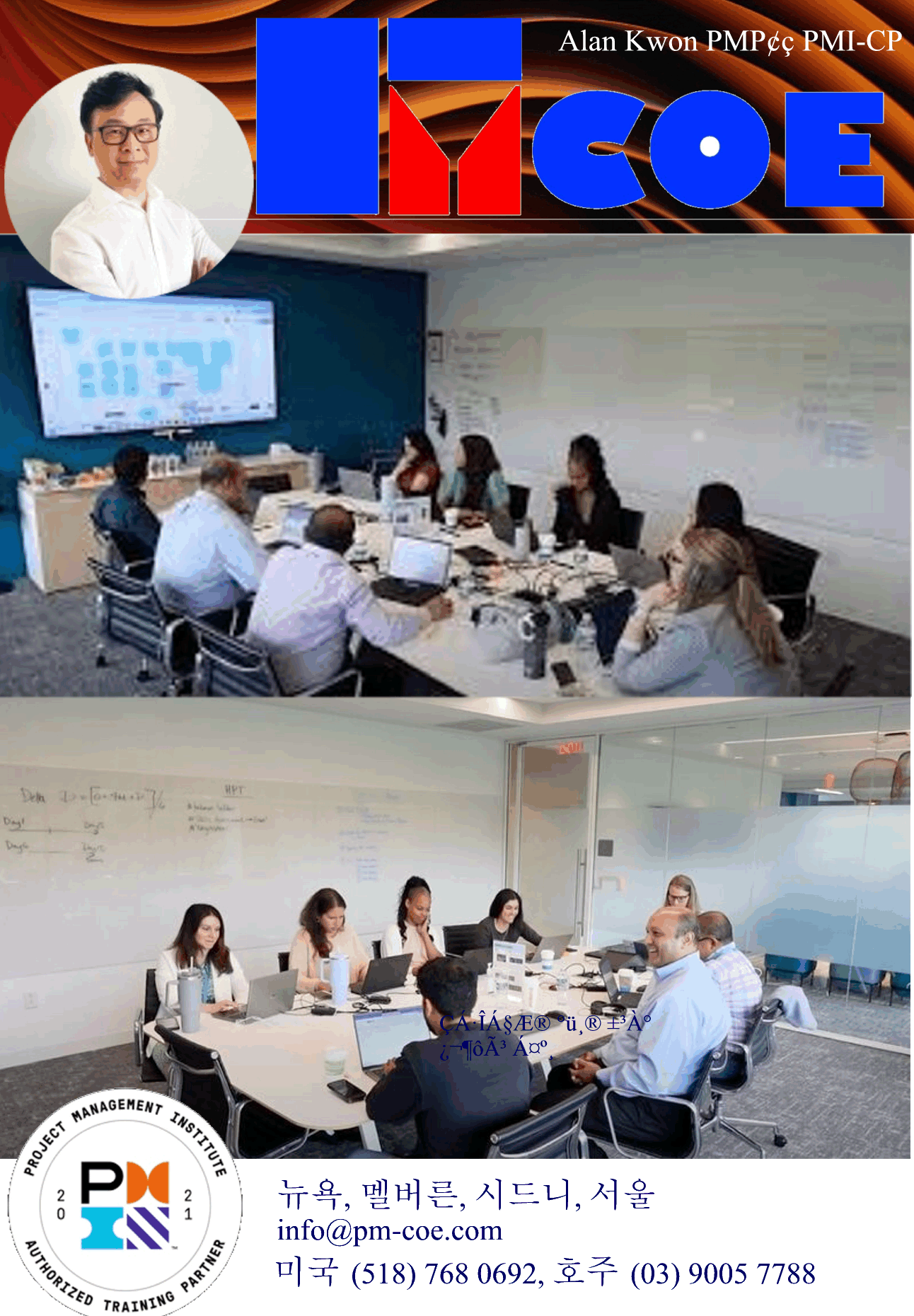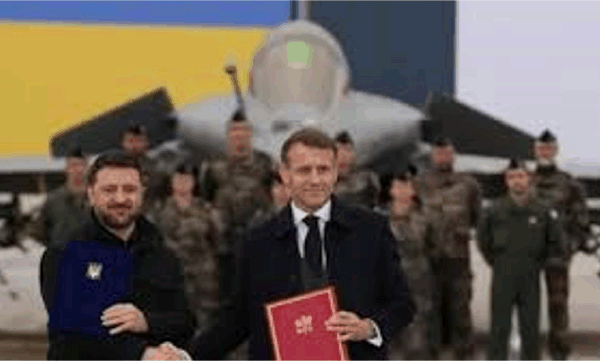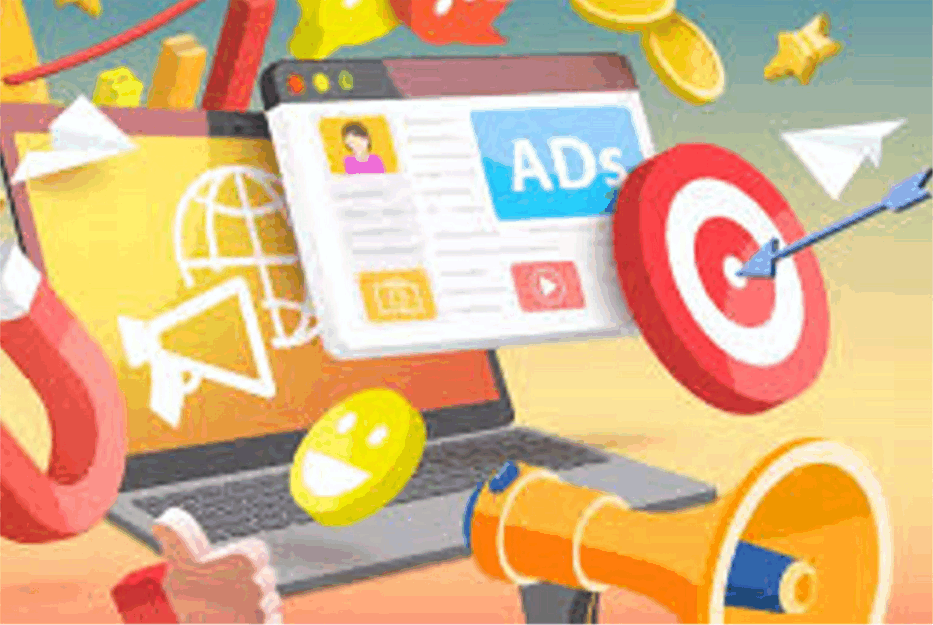고향 탈랑가타의 동상으로 불멸의 제1차 세계 대전 군마 샌디
Tallangatta에서 200마리의 말과 기수들이 모여드는 감동적인 광경으로 주말에 빅토리아 북동쪽의 구불구불한 언덕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 중 24명은 호주 경기병 유니폼을 입었고 나머지는 승마 클럽의 색상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페넌트와 호주 국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집으로 돌아온 유일한 호주 말인 Sandy라는 말의 실물 크기 동상의 제막식에 엄숙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중심가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Tallangatta의 Sandy는 전국의 농장과 기지에서 전쟁에 보내진 130,000~160,000마리의 호주 말 중 하나였습니다.
군마의 역할
말은 분쟁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모래사장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경마의 기마 부대를 수송했고, 서부 전선의 피비린내 나는 들판에서 탄약을 운반했으며, 독가스와 포탄 공격 속에서 중포병을 운반했습니다.
조각가 Brett “Mon” Garling은 “이것은 진정한 호주 이야기이며 Sandy는 어떤 면에서 돌아오지 않고 초점이 된 모든 말을 대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라이더가 없는 샌디를 묘사한 갈링 씨의 조각품은 웨일러 품종의 베이 겔링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살아남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소수의 지역 애호가 그룹에게 그 공개는 4년 간의 작업과 $200,000 이상의 기금 모금의 정점이었습니다.
기념 위원회를 이끄는 로스 스미스(Ross Smith)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야기는 계속 흘러간다. 당신을 사로잡는다.
제막식은 정확히 100년 전 멜버른의 육군 기지에서 샌디가 사망한 시점과 일치하도록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애국적인 몸짓
탈랑가타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샌디의 여정은 1914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O’Donnell 가족이 전쟁 노력에 대한 애국적인 표시로 기부한 그는 전쟁에 파견된 호주 군대의 첫 호송대와 함께 이집트로 항해했습니다.
4월 25일 안작 코브(Anzac Cove)에서 처참한 상륙 작전이 있기 전에 그는 소장 윌리엄 브리지스(William Bridges)의 눈에 띄었습니다.
Bridges 소장은 세 마리의 군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기질 때문에 Sandy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작가이자 전쟁 역사가인 데이비드 카메론은 “브리지는 1915년 갈리폴리에 군대와 함께 상륙했으며 그는 호주 제1사단을 지휘했고 그의 여단인 제3여단이 가장 먼저 상륙했다”고 말했다.
몇 주 후 Bridges 소장은 터키 저격수에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호주 전쟁기념관 큐레이터인 레이첼 케인즈는 “그는 치료를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선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브리지스는 이집트로 이송되어 완전한 군사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샌디와 재회하는 것입니다.”
브리지스 소장은 호주 최초의 육군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캔버라의 던트룬에 묻히기 전에 멜버른에서 또 다른 공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2년 후로 단축되고 Sandy는 이집트에서 호주 동물 병원이 있는 서부 전선으로 갔고 당시 호주의 [George] Pearce 국방부 장관은 10살짜리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샌디라는 이름의 겔딩”이라고 케인즈는 말했다.
샌디의 집으로의 여행
1918년, 깨끗한 건강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역 테스트를 마친 후 Sandy는 영국에서 호주로 배송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독가스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여행하고 경험한 말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던트룬에서 살게 하여 그의 나날을 보내려는 초기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23년까지 Sandy는 눈이 멀고 병들었습니다.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이 특별한 말에 대한 기억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케인즈는 “그를 채워 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쌍의 박제사들이 말의 크기를 측정했지만 머리만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5월에 Sandy는 인도적으로 안락사되었고 박제사들은 작업에 착수했으며 말의 골격은 나중에 Maribyrnong Army Depot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컬렉션에 그의 머리와 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라고 Ms Caines는 말했습니다.
유리 케이스에 봉인된 이 머리는 수십 년 동안 호주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존을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샌디 기념
Tallangatta의 주민들과 O’Donnell 가족의 후손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집으로 돌아온 유일한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품은 또한 Murray 강 상류 근처의 그림 같은 마을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겨서 Sandy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 안치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앞에 물리적인 것이 있을 때 항상 ‘저 말은 뭐였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는 그것이 계속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Mr Garling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Sandy뿐만 아니라 호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모든 동물에게 유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샌디 스크린에서 팀 리의 이야기
ABC TV 또는 ABC iview에서 일요일입니다.
2시간 전에 게시됨
Sandy the WWI warhorse immortalised with bronze statue in hometown Tallangatta
/
By Tim Lee
Posted 2h ago2 hours ago
Help keep family & friends informed by sharing this article
abc.net.au/news/sandy-world-war-one-warhorse-statue-tribute-tallangatta-victoria/102377486
Link copiedCOPY LINKSHARE
The rolling hills of north-east Victoria came alive on the weekend to the stirring sight of 200 horses and riders in Tallangatta.
Two dozen of them wore Australian Light Horse uniforms, others the colours of their riding club. Some carried pennants and the Australian flag.
They lined up along the main street in solemn tribute for the unveiling of a life-sized bronze statue of a horse named Sandy — the only Australian horse to come home from World War One.
Sandy, from Tallangatta, was among 130,000 to 160,000 Australian horses sent to the war from farms and stations across the nation.
The role of warhorses
Horses were essential to the conflict.
They carried the mounted troops of the Australian Light Horse through the sands of the Middle East, lugged ammunition in the bloody fields of the Western Front, and hauled heavy artillery amid poisonous gas and shellfire.
“It’s a real Australian story and Sandy, in a way, represented all those horses that didn’t come back and became the focal point,” said sculptor Brett “Mon” Garling.
Mr Garling’s sculpture, which depicted Sandy riderless in military garb, was based upon the one clear surviving photograph of the Waler breed bay gelding.
For a small group of local enthusiasts, its unveiling was the culmination of four years’ work and more than $200,000 in fundraising.
“It’s very captivating. The story just goes and goes. It grabs you,” said Ross Smith, who headed the commemoration committee.
The unveiling was timed to coincide with the death of Sandy, at an Army depot in Melbourne, exactly a century ago.
A patriotic gesture
Sandy’s journey from Tallangatta to the other side of the globe and back began when war broke out in 1914.
Donated as a patriotic gesture to the war effort by the local O’Donnell family, he sailed to Egypt with the first convoy of Australian troops sent to war.
Before the disastrous amphibious assault at Anzac Cove on April 25, he caught the eye of major general William Bridges.
Major general Bridges had three warhorses but Sandy, because of his temperament, was his favourite.
“Bridges landed with the troops at Gallipoli in 1915 and he commanded the First Australian Division and his brigade, the third brigade, was the first to land,” said author and war historian David Cameron.
Several weeks later major general Bridges was mortally wounded by a Turkish sniper.
“He died unfortunately on a hospital ship on the way back to Egypt for treatment and Bridges is taken back to Egypt and given a full military funeral,” said Australian War Memorial curator Rachel Caines.
“His dying wish, so the legend goes, is to be reunited with his favourite horse, Sandy.”
Major general Bridges was given another public funeral in Melbourne before his burial at Duntroon, Canberra, where he had been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Australia’s first military academy.
“Cut to two years later and Sandy has gone from Egypt to the Western Front with the Australian Veterinary Hospital there and [George] Pearce in Australia, the defence minister at the time, decides that he wants to bring back a ten-year-old gelding named Sandy,” Ms Caines said.
Sandy’s trip back home
In 1918, after completing extensive quarantine tests to ensure a clean bill of health, Sandy was shipped from England to Australia.
Few horses in history have travelled so far and experienced so much, including getting wounded by exposure to poison gas on the Western Front.
But an initial plan to send the horse to live at Duntroon to live out his days never materialised.
By 1923 Sandy was blind and ailing, which posed a dilemma: How best to preserve the memory of this extraordinary horse?
“There’s a discussion whether he should be stuffed and taken to the war memorial,” Ms Caines said.
A pair of taxidermists measured up the horse but decided that only the head would be saved.
In May that year, Sandy was humanely euthanised and the taxidermists set to work, with the horse’s skeleton buried at the Maribyrnong Army Depot afterwards.
“And that’s why we now have his head and neck mounted in our collection,” Ms Caines said.
Sealed in a glass case, the head was on display at the Australian War Memorial for decades but has been removed in recent years to ensure its preservation.
Commemorating Sandy
Residents of Tallangatta and descendants of the O’Donnell family never forgot the only horse to come home from WWI.
The sculpture also meant the picturesque town near the headwaters of the Murray River had a new tourist attraction, one that ensures the story of Sandy would be enshrined for generations to come.
“When it’s a physical thing in front of them there’s always the question asked, ‘What was that horse? What did it do?’ And in that way I guess it lives on,” Mr Garling said.
“I’m hoping that it stands as a legacy to not just Sandy but every animal that served in a war for Australia.”
Tim Lee’s story on Sandy screens this Sunday on ABC TV or on ABC iview.
Posted 2h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