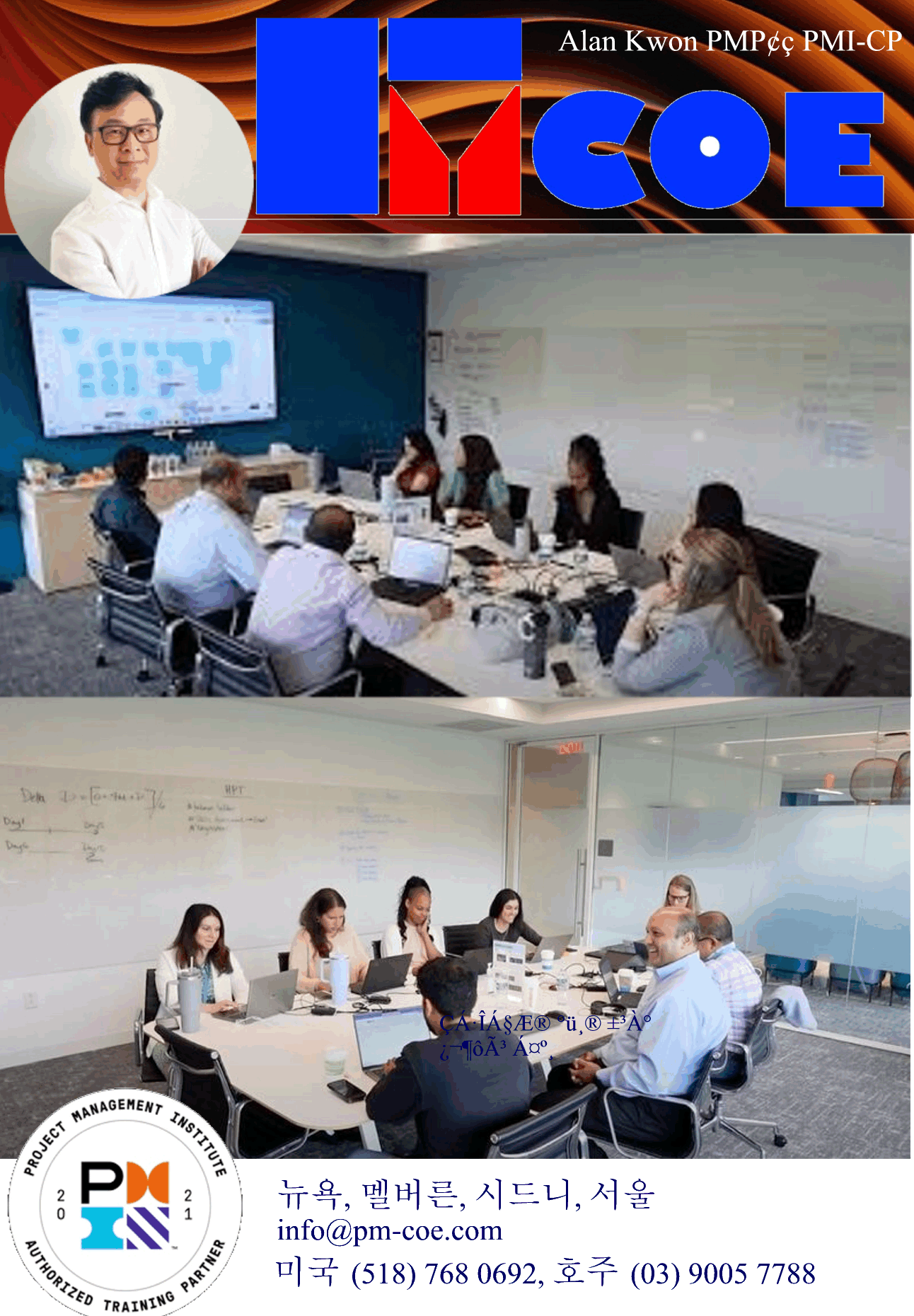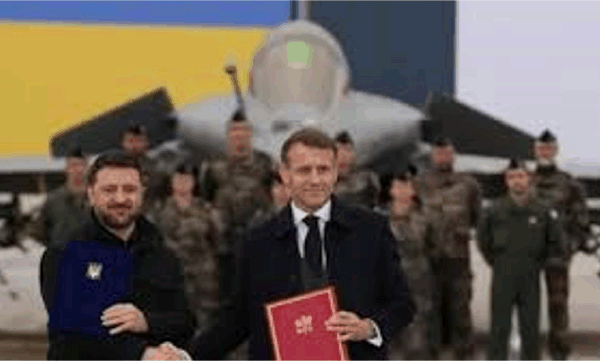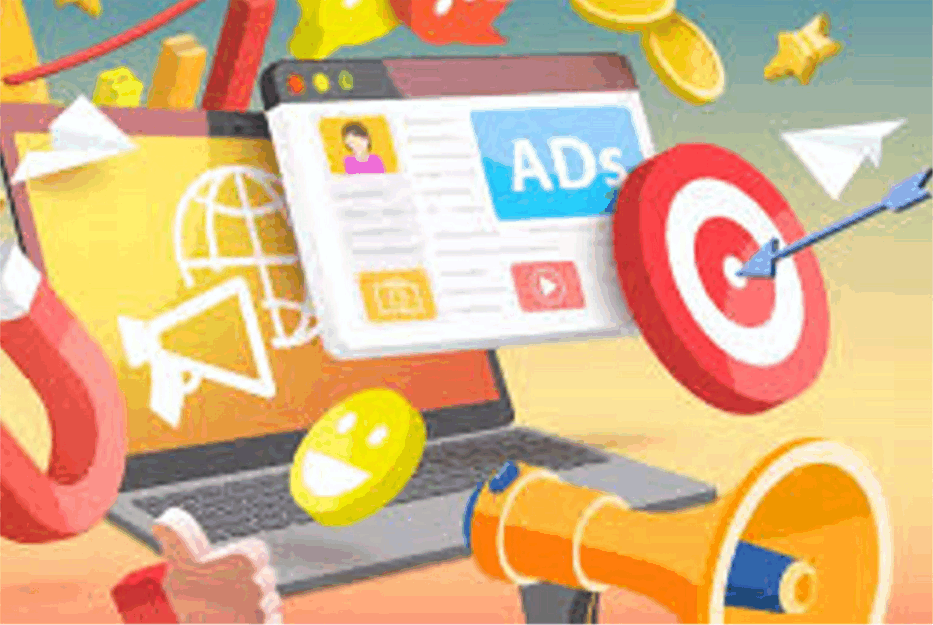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고 멀리 있는 남자의 흑백 머그샷입니다. 그는 제복을 입고 ‘Q129685’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Donald “Jimmy” Edward Waters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3,000명의 원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와 유산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제공: 호주 국립문서보관소)
이 기사를 공유하여 가족 및 친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주세요.
링크 복사됨
링크 복사
공유하다
카밀라로이 출신의 조지 베넷이 제1차 세계 대전을 위해 폐하의 복무를 위해 입대한 지 거의 정확히 107년이 되었습니다.
경고: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독자는 이 기사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16년 4월 26일자 ‘X’로 서명된 Bennett 씨의 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35세였고 홀아비이자 노동자였으며 그의 안색은 “어두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넷 씨는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의 경계에 있는 Mungindi 마을을 떠나 프랑스 서부 전선의 암울한 참호에서 싸웠습니다.
베넷의 증손녀인 도넬라 워터스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유럽에서 싸웠고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길고 검은 수염을 기른 조지 베넷의 흑백 이미지.
Donella Waters의 증조부인 George Bennett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제공)
Bennett 씨는 29대대에서 복무했으며 Gallipoli에 참혹한 상륙을 당한 뒤 모집 활동의 일환으로 입대했습니다.
남자들은 사상자 명단을 보고 자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바쳤을 것이다.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의 문서에 따르면 Bennett 씨는 1918년 전투에서 부상을 입기 전에 프랑스에서 싸우다가 후두염을 앓았습니다. 그는 1919년 “손상 가능성”을 안고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원주민이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유가 보호법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대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책은 일하고 살 수 있는 곳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습니다.
Mr Bennett와 같은 많은 원주민 병사들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희생은 무시되었습니다.
Donella Waters는 “그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그가 받아야 할 명예나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슬프다”고 말하면서 몇 년 후 그녀의 증조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고 덧붙였다.
“단 이틀 후, 그는 감방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년대였습니다.”
Bennett 씨는 표시가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참호 너머의 전투
George Bennett의 전쟁 영웅 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 남았습니다.
그의 손자 “지미” 도널드 에드워드 워터스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수천 명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처럼 양털 깎기로 훈련받은 지미는 권리가 거의 없는 선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군복을 입은 지미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동생을 품에 안고 있는 작품
여동생과 제복을 입은 지미의 이미지.(제공)
First Nations Australians는 원래 입대가 금지되었지만 Jimmy와 그의 남동생 Leonard Waters는 자원하여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손실을 입어 받아 들여졌습니다.
지미의 딸 도넬라 워터스 아줌마는 “그는 ‘나는 항상 조상의 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Jimmy는 의료 연구 부서에 등록하여 연구원들이 열대성 질병과 싸우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라리아를 주사하는 데 자원했습니다.
Waters는 “당시 그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약물을 주입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고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런 다음 지미는 보르네오의 타라칸 섬 최전방에서 싸웠고 워터스는 그녀의 아버지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동료는 그를 Darkie Waters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인종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육군청에서 지미 워터스 장례식 거부
지미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참전 용사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부국장의 기록. (제공: 호주 국립 문서 보관소)
원주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얻고, 다른 전쟁 참전 용사들처럼 토지 보조금을 받고, 연금을 받고, 영예롭게 잠들기를 희망하며 전쟁에 입대했지만 호주 사회에서 종종 외면당했습니다.
도넬라 아줌마는 “그들이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버지가 [전쟁]에 대해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정말 심하게 고통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4년 지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부는 처음에 그를 퇴역 군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Tamworth의 비원주민 남성이 Waters 씨의 매장 자격을 위해 가족이 싸우는 것을 도울 때까지 관례적인 장례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흑인 전쟁 영웅을 기리기 위한 행진
보틀브러시 꽃이 그려진 녹색 화환과 원주민 깃발이 꽂힌 베테랑 모자
퍼스트 네이션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컬러드 디거 이벤트의 일환으로 놓인 화환.(제공: Ken Zulumovski)
풀뿌리 커뮤니티 행사는 2007년 흑인 굴착기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The Colored Digger Event가 탄생했습니다.
Kabbi Kabbi 맨이자 이벤트 주최자인 Ken Zulumvski에 따르면 2023년 Colored Digger 이벤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육군 예비군에 입대한 줄루모브스키 씨는 “색깔 파는 사람 이벤트의 주제는 항상 이름 없는 영웅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싸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에 대한 우리의 역사와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Zulumovski 씨는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트라우마의 세대 간 순환을 끊기 위해 국방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의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줄루모브스키 씨는 자신의 치유와 성장을 도왔던 군대의 다른 원주민들과 연결한 후 두 번째 가족을 찾았습니다.
Ray minniecon이 Ken과 악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미소를 짓고 흰색 버튼 업 셔츠에 네이비 블루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Colored Diggers 이벤트 공동 창립자 Ray Minniecon 목사(왼쪽)와 이벤트 주최자 Ken Zulumovski(오른쪽).(제공)
“멘토링에 굶주려 있었고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강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대에 우리는 입문할 때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가해졌습니다 … 당신의 상처는 내부에 있습니다. 저것’.
줄루모프스키는 “그런 사고방식이 내게 정말 도움이 됐고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줄루모브스키 씨는 원주민 군인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군대 내에서 “문화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이고, 가족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3시간 전에 게시됨3시간 전에, 33분 전에 업데이트됨
Help keep family & friends informed by sharing this article
abc.net.au/news/coloured-diggers-march-indigenous-servicemen-anzac-day/102259612
Link copiedCOPY LINKSHARE
It is almost exactly 107 years since Kamilaroi man George Bennett enlisted to serve in His Majesty’s Service for the Great War.
WARNING: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readers are advised that this article contains images of people who have died.
He was 35 years old, a widower, a labourer and his complexion listed as “dark”, according to Mr Bennett’s attestation papers that are signed with an ‘X’, dated April 26, 1916.
Mr Bennett left the town of Mungindi, on the border of New South Wales and Queensland, and fought in the grim trenches of France’s Western Front.
“I do know that he fought in Europe and he came back home after the war,” Mr Bennett’s great-granddaughter, Donella Waters, told the ABC.
“It makes it so proud.”
Mr Bennett served with the 29th Battalion, and enlisted as part of the recruitment drive that followed the disastrous landing at Gallipoli.
The men may have seen the casualty list and offered themselves, knowing that they might suffer the same fate.
Documents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suggest that Mr Bennett suffered with laryngitis while fighting in France before he was wounded in action in 1918. He returned to Australia by ship in 1919 with “possible mutilations”.
It was a time where Aboriginal people weren’t accepted as citizens and freedom was replaced with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Protection Act, which controlled every aspect of their lives, from where you could work and live, to who you could marry.
Many Indigenous soldiers, such as Mr Bennett, returned home scarred and their sacrifice ignored.
“It’s very sad that he fought for this country, never got the honour or respect that he should have gotten,” Donella Waters said, adding that, years later, her great-grandfather was arrested and jailed for being drunk and disorderly.
“Only two days later, he died in the cell alone.”
“That goes to show you that nothing has changed much since those days. And that was in the 50s.”
Mr Bennett has been buried in an unmarked grave.
Battle beyond the trenches
George Bennett’s war hero legacy would live on through the generations.
His grandson, “Jimmy” Donald Edward Waters, was one of the thousand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to serve in World War II.
Originally trained to be a shearer like his dad, Jimmy grew up with the mission way of life, with few rights.
First Nations Australians were originally banned from enlisting, but Jimmy and his little brother, Leonard Waters, volunteered to fight, and were accepted due to the high losses at the beginning of the war.
“He said, ‘I’m always fighting for my ancestors’ land’,” said Jimmy’s daughter, Aunty Donella Waters.
Jimmy enrolled with the medical research unit, volunteering to be deliberately injected with malaria to help researchers find ways to fight tropical diseases.
“You can just imagine how many drugs they injected into him at that time,” Ms Waters said.
“He was awarded for his service and quite happy to be part of that research. That was a very special occasion for him.”
Jimmy then fought on the frontlines of Tarakan Island in Borneo where, Ms Waters says, her father experienced discrimination.
“His comrade’s called him Darkie Waters. And I think that, that goes to show you that there was a lot of racism.” she said.
Indigenous people enlisted in the war with hopes to get equal rights, receive land grants like other war veterans, receive a pension and be laid to rest with honour, but they were often shunned by Australian society.
“It was traumatic and hard for them to express themselves … My dad did talk a little bit about [the war] but I think they suffered really badly from it,” Aunty Donella said.
When Jimmy passed away in 1974, the government initially refused to recognise him as a veteran and denied the customary funeral benefit payment until a non-Indigenous man in Tamworth helped the family fight for Mr Waters’s burial entitlements.
Marching to honour Black war heroes
A grassroots community event sought to correct the record on Black diggers in 2007: The Coloured Digger Event was born.
The 2023 Coloured Digger Event is set to be the biggest one yet, according to Kabbi Kabbi man and event organiser, Ken Zulumvski, with thousands of people expected to attend.
“The theme for the Coloured Digger Event is always about unsung heroes,” explained Mr Zulumovski, who joined the Army Reserve in his early 20s.
“[It’s] a recognition of our history and contribution to all the conflicts, not just the ones fought overseas.”
Mr Zulumovski decided to join the defence force to break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poverty and trauma impacting his family.
“I was just really keen to try and make something of myself,” he said.
Mr Zulumovski found a second family after connecting with other Indigenous men in the army, who helped him heal and grow.
“I was really hungry for mentorship and looking for a strong man in community because I wanted to be like that,” he said.
“I met [one man] and he said: ‘In traditional times, we would be scarred in initiation. Our pain would be inflicted on us to force us to grow … Your scars are on the inside, so you have to see it like that’.
“That kind of mentality really helped me and I never forgot that,” Mr Zulumovski said.
Now there is a “culture renewal” within the army that Mr Zulumovski says is making a positive experience for Aboriginal servicemen and women.
“It’s the best leadership training that you can get in the military, and there’s a culture of family and customs and tradition.”
Posted 3h ago3 hours ago, updated 33m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