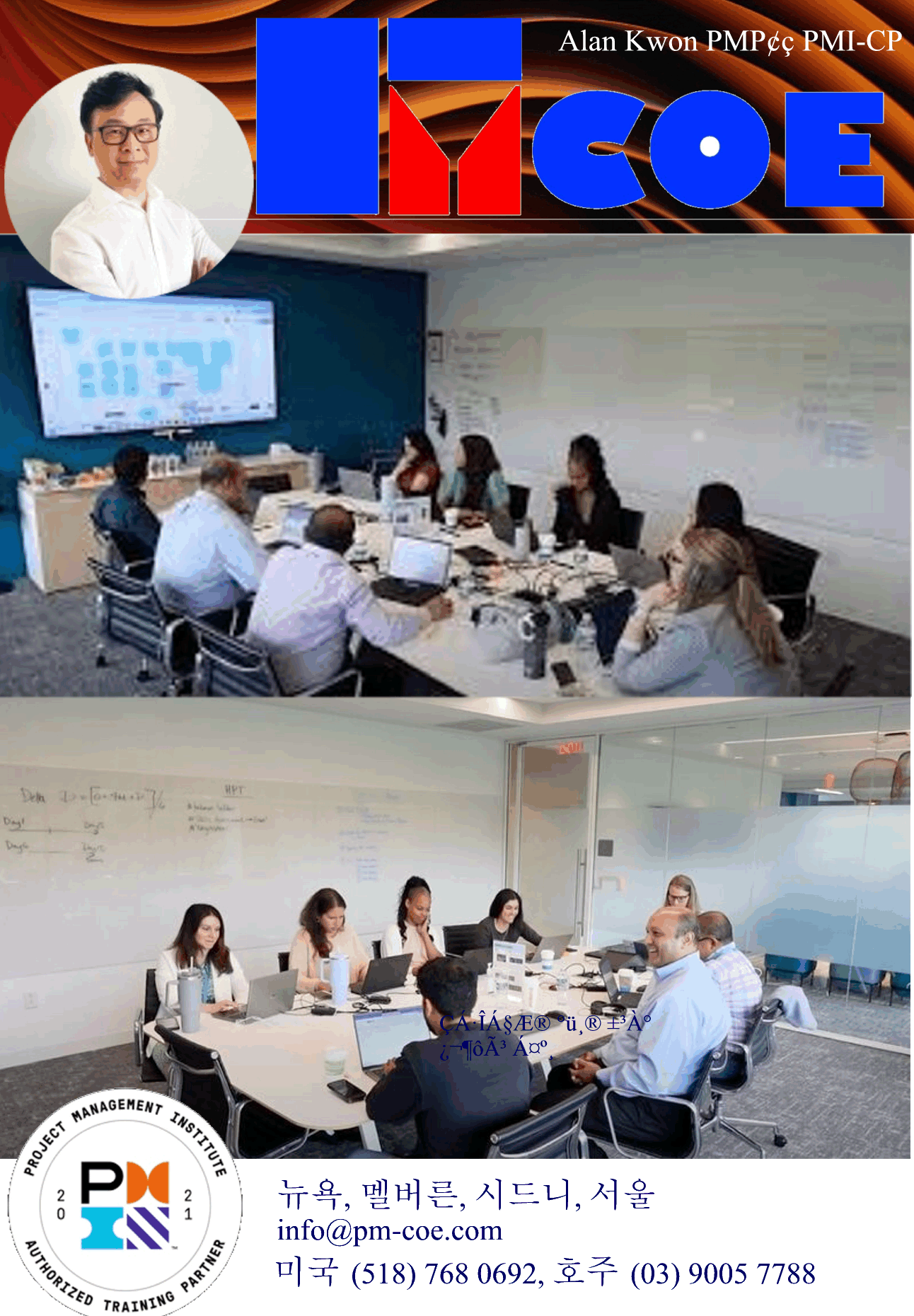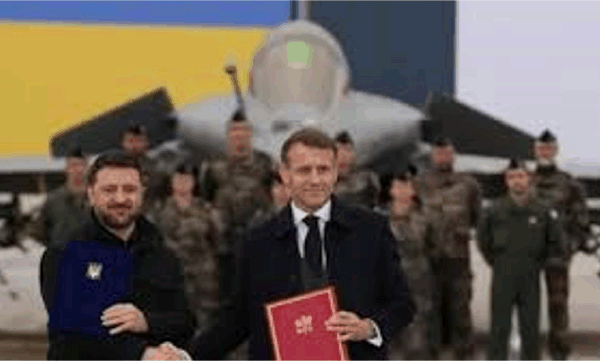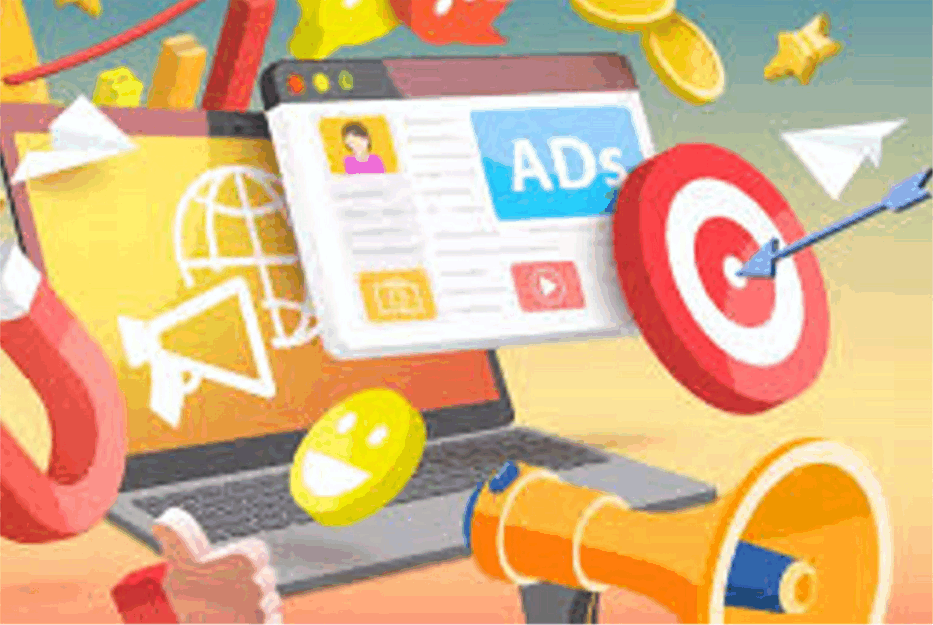북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숨겨진 마을
진 맥켄지 – 서울 특파원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2:51 AEDT
신씨가족
경호, 미선씨와 그들의 아이들은 비무장지대 내 남한 마을의 가장 어린 주민이다.
경호와 미선의 사랑은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다.
그들은 파티에서 눈을 마주쳤고, 즉시 불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금새 사랑에 빠졌고, 경호는 미선에게 동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북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남한 마을에 살고 있다. 미선의 아버지는 겁에 질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들을 방문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살면서 제일 힘든 게 프라이드치킨을 배달 못 받는 거다”라고 미선은 농담한다. 그리고 엄격한 야간 통금 시간도 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북한을 가르는 무인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뢰가 깔려 있으며 수십만 발의 포병이 양방향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두 군대를 분리하기 위해 창설됐다. 수백 개의 마을을 청소해야 했고, 수천 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남쪽의 자유마을과 북쪽의 평화마을은 두 마을만 남도록 허용됐다.
이 작은 희망의 등불은 DMZ가 일시적이고 머지않아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전망은 희박해 보이고, 늙은이가 죽고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마을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경호와 미선과 어린 두 아이를 둔 가족은 이상하다.
BBC 아이플레이어
BBC 아이플레이어
적진 사이에서 생활하기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한 마을에 대한 보기 드문 통찰입니다.
지금 BBC iPlayer에서 시청하세요(영국만 해당)
영국 이외의 시청자는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BC 아이플레이어
BBC 아이플레이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 중 하나의 문앞에 사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겨줍니다. 미선씨는 작년에 미군 트래비스 킹이 DMZ를 둘러보던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갔던 다사다난한 날을 회상한다. 그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즉시 집으로 보내졌고 주민들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내가 이런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생각난다”고 그녀는 말했다.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자유 마을(한국어로 태성)에 가려면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장갑 탱크 열을 넘어 북쪽으로 운전하여 땅이 열리면서 수십 개의 황금빛 논과 작은 집들이 드러날 때까지 운전합니다.
식당도, 의료시설도, 상점도 하나도 없고, 80~90대 노인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800명이 넘는 군인들의 경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마을 입구
태성자유마을 입구를 상징하는 푸른색 아치형 입구
평화로운 안뜰에는 작은 나이든 여성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채 등을 구부린 채 집에서 만든 도토리 젤리를 휘젓고 서 있습니다. 줄무늬 햇빛모자는 그녀의 풍화된 얼굴과 거친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김동래는 전쟁이 기묘한 운명을 결정하기 몇 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밤에 마을이 총격을 받았을 때 창문을 통해 총알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힘차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85세의 그녀는 여섯 자녀 중 두 명, 그리고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더 편해졌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DMZ 밖으로 데려가는 버스가 일주일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녀가 주말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떠날 때 그녀는 다음 금요일까지 밖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세 대의 버스가 있고, 파티를 하는 날이 지나서 그녀는 머리를 다듬기 위해 두 달에 한 번만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번거롭습니다.”라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군인들과 김동래
김동래는 젤리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따러 나갔다.
한번은 젤리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캐던 김동래는 전선 남쪽에서 북한군을 발견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 그녀의 친구 홍씨는 도토리를 수집하던 중 우연히 국경을 넘어갔다가 북한에 납치되어 3일 동안 억류되었다.
이제 김씨는 외출할 때마다 무장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걱정이 덜해진다. “우리와 북한 사람들은 서로 등을 대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이 마을은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군인들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군대인 유엔 사령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휴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한국과 태성 주민들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최전선에 서 있다.
11월, 평화 유지 협정이 결렬된 후 양측은 DMZ 내에서 군대를 재무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두 나라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장 경비원 농부의 군인
군인들이 북한 국경을 따라 농사를 짓는 동안 마을 주민들을 지키고 있다
마을을 지키는 정예 군인 대대를 이끄는 크리스 메르카도 미 중령은 “마을은 매일 위험하지 않지만 위험은 엄청나게 높다”고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어요.”
Mercado 중령의 병사들이 밤낮으로 순찰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고를 받으면 국경에 가까운 들판으로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북한 가족이 막 탈북해 배를 타고 남한으로 건너왔다. 북한의 국경 수비대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듣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그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DMZ에서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BBC 지도에는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기정마을, 남한의 태성마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BBC 지도에는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기정마을, 남한의 태성마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선을 따라 이어지는 들판으로 걸어갑니다. 주민이 마지막 벼를 쟁기질하는 동안 기관총을 든 군인 두 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장복을 입고 경비를 서며 눈으로 북쪽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을과 북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울타리나 장벽은 없습니다. 녹슨 표지판만이 보이지 않는 선을 표시하고 나무와 관목이 빽빽하게 얽혀 있습니다. 쟁기 소리가 잦아들자 북쪽에서 군인들이 노래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김동구 태성시장은 “여기 오면 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없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표시하는 표지판 근처로 걸어가는 군인
녹슨 표지판은 남북한의 국경을 표시합니다
낮에는 트랙터 소리나 경비견이 짖는 소리만이 속이는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김 시장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늘 걱정한다. “당신에게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으스스함과 타고난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둠이 내리자 주민들은 집으로 사라진다. 오후 7시 이후에는 외출 허가가 필요하며 자정 이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밤마다 점호를 시작하고 집집마다 두드리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마을의 밤 풍경
밤이면 주민들은 북한의 ‘평화마을’의 불빛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과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머물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특전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세금이나 집세를 내지 않으며, 극도의 고립감과 함께 풍부한 농지가 뒤따릅니다. 팔 수 없는 농작물은 정부가 사게 됩니다.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전쟁 중에 마을을 지키기 위해 16세에 무기를 든 김경래에게는 충분히 좋은 거래이다.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햇살을 받기 위해 현관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87세인 그는 자신이 한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북한 침입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을을 순찰하는 군인이 개를 쓰다듬는다
군인들은 엄격한 통금 시간 이후 밤에 마을을 순찰합니다.
태성의 상징성은 김씨와 다른 건국 주민들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두 습관과 필요 때문에 이곳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태어난 곳이고, 농업은 그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위해 싸운 세대가 여기서 죽겠다는 체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 중 다수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김씨의 여섯 딸은 모두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떠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금 더 아팠습니다.
여행 중에 셋째 딸 윤경이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다정하게 그의 옷을 펴고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느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김경래, 딸 윤경과 함께
마을을 떠난 셋째딸 윤경과 함께 있는 김경래
대학 졸업 후 남편을 만나 취업했고, 현재 부부는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수년 동안 남성은 파트너를 마을에 데려오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떠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이후 규칙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테드하지만 아마도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약으로 인해 졸린 태성은 더 이상 현대 한국의 밝은 빛과 무한한 기회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는 213명에서 138명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노인 인구의 비율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경호와 미선의 아이들이 다니는 마을의 최신식 초등학교에는 학급당 학생이 6명뿐이고 그들 대부분은 DMZ 밖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한다.
이 부부의 10살 아들은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태성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을의 또 다른 특권이기도 합니다.
신어린이놀이
마을에는 소수의 아이들만이 살고 있다.
그러나 미선과 경호는 어느 날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체념한다. 그들은 철조망 너머의 세계를 여행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호씨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아마도 미래에는 이 마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짧은 표현형 회색 선
시청 옥상에서는 165m 높이의 깃대가 인상적인 기종 평화마을과 북한이 한눈에 들어온다. Mercado 중령은 일부 건물을 가리키며 창문이 칠해진 단순한 정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오래 전에 기종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메르카도 사령관
시청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메르카도 사령관
그러나 UN 사령부 메르카도 중령과 그의 팀은 태성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이 머물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마을 주민들이 거주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곳에서 보내야 하는 밤 수를 현재 8개월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메르카도 중령은 마을이 사라지게 놔두면 남부가 평화와 통일을 포기했다는 신호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휴전 협정 조건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버려진 북한 마을의 모습
북한은 오래 전에 DMZ 안의 마을인 기정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통일 가능성은 낮아진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거나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꿈이 희미해지면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최전선에서 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동래 씨는 올해가 도토리묵을 만드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 그녀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다른 친구가 전화를 걸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동래는 “버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힘들지. 마을이 생기기 훨씬 전에 나는 사라질 거야.”
이호수, 최이현 추가 제보

The hidden village just metres from North Korea
모든 사진 신용주 기자
Jean Mackenzie – Seoul correspondent
Thu, 14 March 2024 at 12:51 am AEDT

Gyung-ho and Mi-sun’s is a classic love story.
They locked eyes at a party, and immediately felt a spark. They quickly fell in love, and Gyung-ho asked Mi-sun to move in with him.
But there was a catch.
Gyung-ho lives in the only South Korean village in the Demilitarised Zone (DMZ), mere metres from North Korea. Mi-sun’s father was horrified. He was so worried he couldn’t sleep after visiting them for the first time. “But really, the toughest thing about living here is not being able to get fried chicken delivered,” Mi-sun jokes. That, and the strict night-time curfew.
Contrary to its name, the strip of no-man’s land separating North and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militarised places on earth. Encircled by barbed wire and carpeted in mines, hundreds of thousands of rounds of artillery point in both directions. It was created in 1953, after the Korean War, to keep the two armies apart. Hundreds of villages had to be cleared, forcing thousands from their homes.
But two villages were allowed to remain – Freedom Village, to the south of the ceasefire line, and Peace Village to the north.
These small beacons of hope were supposed to signal that the DMZ was temporary and one day soon Korea would be reunified. But 70 years on, the prospect of unification seems slim, and the village’s numbers are dwindling, as the old die and the young leave, making Gyung-ho and Mi-sun, with their two small children, unusual.

A rare insight into a village which sits within Korea’s Demilitarised Zone.
Watch now on BBC iPlayer (UK Only)
Viewers outside the UK can watch here

Living on the doorstep of one of the world’s most hostile states carries significant risk. Mi-sun recalls the eventful day last year when the US soldier, Travis King, ran across the border from South Korea into the North, while on a tour of the DMZ. Her children were immediately sent home from school, and the residents put under lockdown.
“Things like this happen every few years and I’m reminded I’m living in this kind of village,” she says.

To reach Freedom Village, known in Korean as Taesung, we have to pass through several checkpoints. From there we drive north, beyond rows of armoured tanks, until the land opens out to reveal dozens of golden rice fields and a small cluster of homes.
There are no restaurants, medical facilities, nor a single shop, and the villagers, many now in their 80s and 90s, live under the guard of more than 800 soldiers.
“I wish I could get it done more, but it’s a hassle,” she shrugs.
In a peaceful courtyard, a tiny elderly woman stands swirling a batch of home-made acorn jelly, her back hunched from decades of farming. A striped sunhat protects her weathered face and wild hair.
Kim Dong-rae was born on this land years before the war would decide its peculiar fate.
She remembers bullets streaking past her windows at night, as the village was caught in the crossfire.
“Don’t get me started on that terrible war,” she says, gesticulating energetically. At 85, she has outlived two of her six children, as well as her husband who died young after being shot in the stomach by a North Korean soldier.
Raising her children alone, in a perpetual state of high alert, was stressful and lonely, she says, though life became easier as the years passed. Initially there was only one bus a week to take them out of the DMZ, meaning when she left for a weekend of drinking and dancing, she’d be stranded outside until the following Friday.
But now there are three buses a day, and with her partying days behind her, she only ventures out once every two months to get her hair done.

Once, while foraging for acorns to make her jelly, Kim Dong-rae spotted North Korean soldiers on the southern side of the line. Frightened, she screamed and ran, and with good reason.
In 1997, her friend Mrs Hong was kidnapped by the North Koreans, after accidently straying over the border while collecting acorns, and was held captive for three days.
Now Mrs Kim is escorted by armed soldiers on most of her outings, meaning she worries less. “We and the North Koreans, we live with our backs to each other,” she says.

The village is ru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 a US-led army, comprising soldiers from more than a dozen countries. The force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armistice holds. There has never been a peace dea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residents of Taesung are on the front line of flaring tensions.
In November, both sides rearmed their troops inside the DMZ, after a peace-keeping deal broke down. Then, at the start of this year,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randed South Korea his number one enemy, and declared tha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had become impossible.

“The village is not dangerous day to day, but the risk is incredibly high,” says US Lieutenant Colonel Chris Mercado, who leads the elite battalion of soldiers that secures the village. “There is nowhere like this anywhere else in the world.”
Lt Col Mercado’s soldiers patrol day and night. They even accompany the residents as they farm. They are preparing to take us to the fields close to the border when we are alerted to a potential threat.
A North Korean family has just escaped the country and crossed over to South Korea by sea. The border guards in the North will be on high alert and likely watching our every move we’re told, and our presence might spook them. So, for now, we must stay where we are. It is a reminder of how unpredictable life in the DMZ can be.

Once the risk has subsided, we walk out to a field which runs along the line dividing the North and South. As a resident ploughs the last of his season’s rice, two soldiers with machine guns stand guard, dressed head to toe in camouflage, their eyes scanning for movement in the north.
There are no fences or barriers physically separating the village from North Korea. Only a rusty sign demarks an invisible line, along with a dense tangle of trees and bushes. When the noise of the plough subsides, we hear the faint sound of soldiers singing on the northern side.
“It always breaks my heart when I come here,” says the mayor of Taesung, Kim Dong-gu. “We are one people, yet we can’t talk to each other, we can only stare from afar.”

During the day, only the sounds of tractors or barking guard dogs puncture the deceiving serenity. Mayor Kim worries constantly about his villagers’ safety. “It might seem peaceful to you,” he says, “but there is an unseen eeriness, an innate fear.”
As darkness falls, the residents disappear into their homes. They need permission to leave after 7pm and are not allowed out after midnight. The soldiers embark on their nightly rollcall, knocking door to door, but it is a formality. The network of surveillance cameras means they already know where everyone is.

To offset these rules and risks, the villagers are offered some major perks to convince them to stay. They do not pay taxes or rent, and their extreme isolation comes with an abundance of farmland. Any crops they cannot sell, the government will buy.

It is a good enough deal for Kim Kyung-rae, who took up arms aged 16 to defend the village during the war. “I think you can reasonably say this is paradise on earth,” he says smiling, as we sit on his porch to catch the evening sun.
The 87-year-old boasts that not only is he one of the richest famer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he has world-class security looking after him.
But this has not stopped him from installing his own CCTV cameras, to scan for North Korean intruders.

The symbolism of Taesung appears lost on Mr Kim and the other founding residents. They all say they have remained here out of habit and necessity – it is where they were born, and farming was all they knew. But while the generation who fought for this land is resigned to dying here, many of their children have moved on.
All six of Mr Kim’s daughters left to continue their education, never to return. With each departure, his heart broke a little more.
During our trip, his third daughter, Yoon-kyung, paid him a visit. Affectionately she straightened his clothes and combed his hair. “Growing up, I felt this was a dangerous place, but I wasn’t afraid,” she said. “I just had no reason to come back.”

After university she met her husband, got a job, and the couple now live in Seoul with their children. For many years men were allowed to bring their partners to live in the village, but women were not, forcing them to leave for love.
The rules have since been updated but perhaps too late. Sleepy Taesung, with all its restrictions, can no longer compete with the bright lights and boundless opportunities of modern-day South Korea. Over the past decade its population has dropped by a third from 213 to 138, while the proportion of elderly residents has doubled.
There are only six students per class at the village’s state-of-the-art primary school, which Gyung-ho and Mi-sun’s children attend, and most of them are bussed in from outside the DMZ.
The couple’s 10-year-old son seems unfazed by his surroundings. He wants to live in Taesung forever, he says, in part because it would exempt him from completing South Korea’s mandatory military service – another of the village’s perks.

But Mi-sun and Gyung-ho are resigned to their children leaving one day. They want them to travel and experience a world beyond the barbed wire. “It is asking a lot for young people to live here,” Gyung-ho says, adding that the village would probably not exist in the future.

From the roof of the townhall, we are able to get a clear view into North Korea, and the Peace Village of Kijong, complete with its imposing 165-metre flagpole. Lt Col Mercado points to some of the buildings, explaining they are mere facades, with the windows painted on. The North Koreans are thought to have abandoned Kijong long ago.

Yet Lt Col Mercado and his team at United Nations Command are determined to keep Taesung running and are brainstorming ways to persuade people to stay.
One op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nights the villagers must spend here to retain their residency, down from the current eight months.
Lt Col Mercado fears if they let the village vanish, it would signal that the South had given up on peace and reunification. “It would send a very strong message that the terms of the armistice are no longer being enforced,” he says.

But as each year passes, reunification looks less likely. Not only has the North officially abandoned the policy, but an increasing number of South Koreans no longer believe it is necessary, or even want it. As this dream fades, it is getting harder to convince people to live on the front line of an unresolved conflict.
Kim Dong-rae says this will be the final year she makes her acorn jelly. Last week, she attended a friend’s funeral. Afterwards another friend phoned and begged her to hold on. “It’s just you and me left now,” she said.
“I’m trying to hold on,” Dong-rae tells me. “But at our age it’s hard. I’ll be gone, long before the village is.”
Additional reporting by Hosu Lee and Leehyun Choi
All photographs by Shin Yong-ju